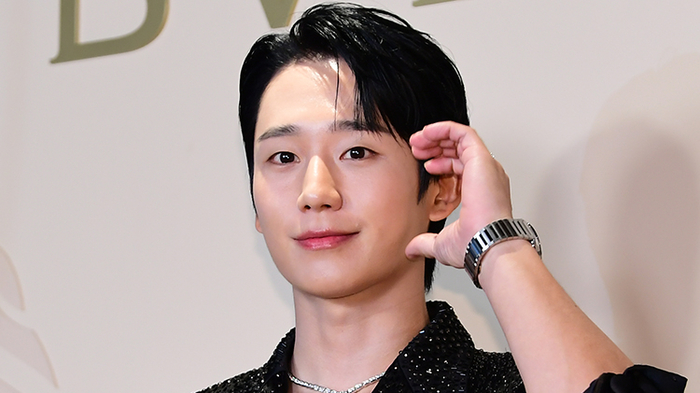하지만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요원하다.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곳의 의대는 등록 거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경북대는 학생 절반가량이 미등록으로 제적 위기에 놓였다.
여러 회유에도 이들이 요지부동인 건 의사 사회의 특이성 때문이다. 의사 사회는 학생과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으로 잘게 분화돼 있어 어느 한 집단이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 누구든 목소리를 내면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나서느냐'는 공격이 따르기 일쑤다.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실명을 걸고 복귀 호소문을 냈을 때 동료와 선후배들의 무자비한 폭언이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지금 나서야 하는 주체는 대한의사협회다.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로 정부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14만명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자부하지 않는가. 문제는 학생들의 제적이 코앞임에도 의협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상임이사회가 열렸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메시지나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의협 측은 '의대생도 성인인데 우리가 말한다고 듣겠냐'고 반문한다. 사태 해결의 핵심을 여전히 못 짚고 있다. 강의실에 학생들을 강제로 앉혀두란 얘기가 아니다. 복귀를 망설이는 이들이 당당하게 '명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공식 메시지를 주라는 것이다. "이젠 제자리로 돌아갈 때"라고 말이다.
앞서 의료계가 정부에서 '내년도 증원 0명'을 받아낼 때도 의협의 역할은 없었다. 올 초 선출된 의협 회장은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은 지 오래다. 긴 침묵은 결국 '의사 사회 대표'라는 존재 당위성을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의무를 잊은 건지, 의지조차 없는 건지 자문해볼 때다.
[심희진 과학기술부 edge@mk.co.kr]